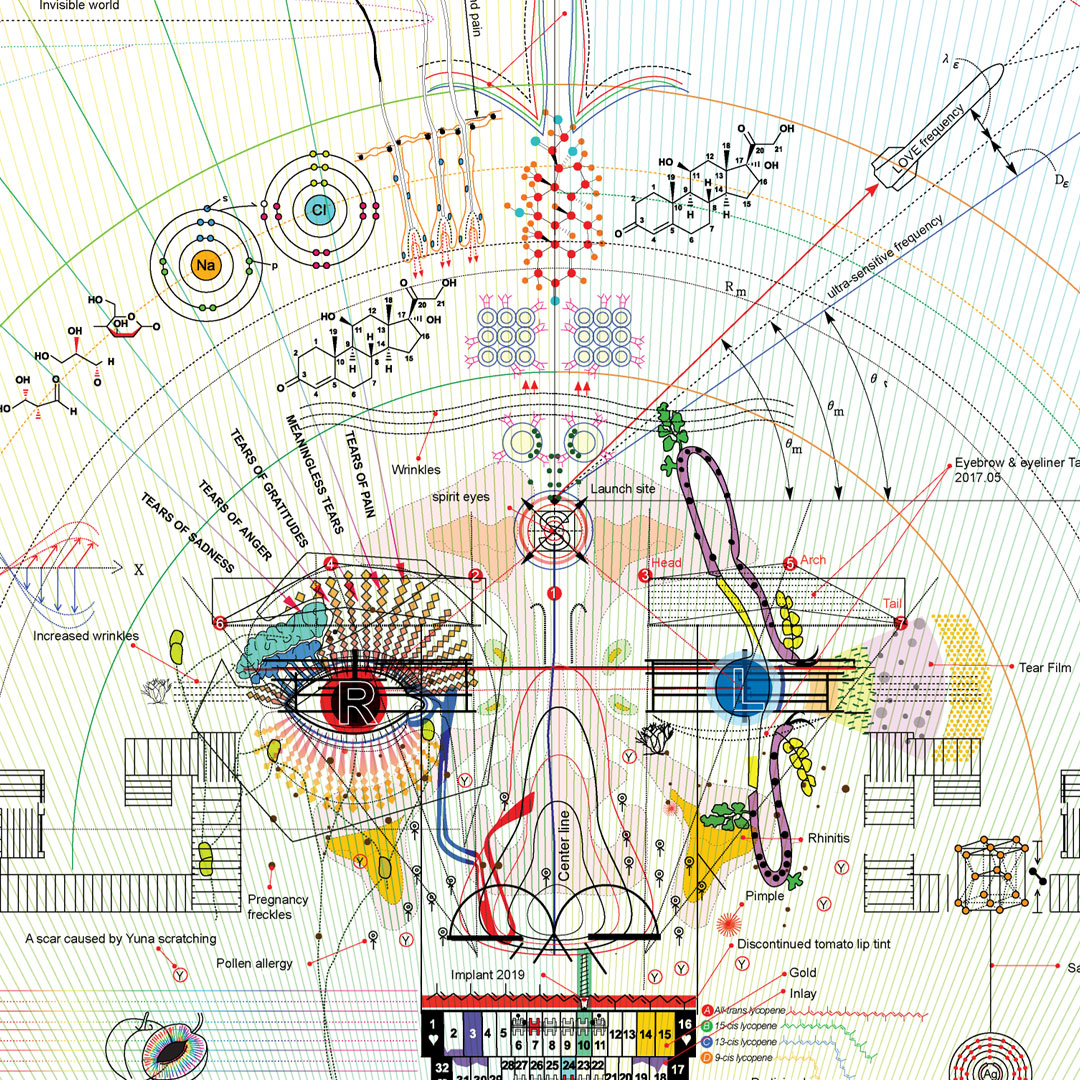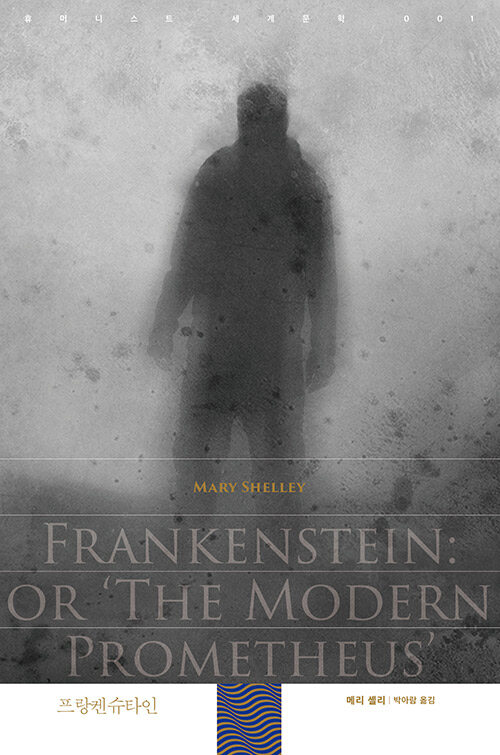* ‘Icon・Index・Symbol’ 시리즈는 배재희 디렉터가 선곡한 음악과 함께 즐겨보세요.
푸른빛의 정적, 그리고 시지프의 바위


하루하루는 여전히 길지만 해는 갑자기 짧아졌다. 겨울은 이렇게 온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과 빠르게 사라지는 빛 사이, 그 역설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일어나 일을 하러 가는 단순한 삶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같지 않다. 반복되는 일상 속 미세한 차이들이 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만든다. 아키 카우리스마키Aki Kaurismäki*의 인물들처럼.
1957년 핀란드에서 태어난 카우리스마키는 6년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와 <사랑은 낙엽을 타고Fallen Leaves>(2023)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영화 속 인물은 텅 빈 방의 푸른빛, 공장으로 향하는 아침, 낡은 식당에서 짧은 식사를 하며 어제와 같은 피로를 안고 무표정하게 서로를 바라본다. 라디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흘러나오고 현실은 버석거린다. 이런 이들의 일상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말한 ‘시지프의 신화Le Mythe de Sisyphe’를 떠올리게 한다.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처럼 실직과 이별과 가난이 반복되지만, 그들은 매일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린다. 그러나 카뮈가 “세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듯, 그의 인물들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묘한 틈을 만든다.
*아키 카우리스마키(Aki Kaurismäki, 1957~ )는 핀란드 오리마틸라 출생의 영화감독·각본가로, 1980년대부터 장편영화를 연출해 왔다. <과거가 없는 남자>(2002)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으며, <낙엽>(2023)으로 다시 칸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유럽 작가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절망을 거부하는 ‘무표정의 저항’

카우리스마키의 유머는 바로 그 틈에서 생긴다, ‘상황의 비극성’과 ‘태도의 담담함’ 사이에서 피어나는 무언가. 그는 말한다.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는 건 너무 쉽다.
비극적인 세상일수록, 나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다.”
그래서 영화 속 인물들은 절망할 이유가 가득한 순간에도 절망에 잠식되지 않는다. 상대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내놓을 것이 소시지와 감자가 전부뿐이더라도 그 순간을 위해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꽃을 산다. 이 엉뚱하고 진지한 행동들은 관객에게 작은 웃음을 남기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다. “그래도 살아간다”는 인간의 품격에 대한 조용한 경의다. 시지프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신에 대한 반항이듯, 카우리스마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무표정한 유머는 비정한 세상을 향한 가장 사적이고 우아한 저항이다.

‘혼자’에서 ‘우리’로 : 연대의 온기


카우리스마키의 웃음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체념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영화 속 인물들은 소외된 서로를 알아보고 작은 호의를 건넨다. 명언도, 감동적인 장면도 없다. 그저 퇴근 후 마시는 술 한잔, 낡은 주크박스에서 흐르는 음악, 그리고 곁에 있어 주는 말 없는 동행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늘 혼자로 시작해 결국 ‘우리’가 되는 과정으로 끝나며,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절대적인 선의’는 차가운 핀란드의 풍경 속에서 희미한 온기를 만든다. 혼자로 시작해 결국 ‘우리’가 되어 계속 살아가는 그의 영화들은, 바위를 홀로 미는 형벌을 견디던 시지프가 곁에 있는 또 다른 시지프를 발견하는 순간과도 같다.

저채도의 희망, 그리고 계속되는 삶

카우리스마키의 미학은 느리고 단순하다. 그의 카메라는 멈춘 듯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인물들은 마치 연극처럼 정면을 응시한다. 영화 전반의 색채는 청록, 빨강, 오래된 갈색이 주를 이루고 공장 앞, 싸구려 바, 낡은 아파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는 세련되기보다 어둡고 칙칙하지만 이는 핀란드 노동 계층의 소외된 현실을 건조하게 담아내는 의도된 멜랑콜리다. 그러나 그 절제되고 바람에 바랜 듯 낮은 저채도의 아름다움 속에는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한 희망이 담겨있다. 그의 영화를 관통하는 사랑, 희망, 그리고 연대는 시각적 암울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서로의 선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작은 호의를 주고받지만, 오히려 관객들은 이 비정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순수함이 배신당하지 않을까?’는 마음 속 의심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감독은 끝내 그 의심을 절대적인 선의로 해소한다.

카우리스마키의 인물들은 현실을 뒤엎을 영웅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잃어도 다시 라디오를 켜고, 낡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그 시선 안에서 관객은 감정의 파도를 느낀다. 웃음이 일어나기 전의 침묵, 농담이 끝난 뒤의 여운. 카우리스마키는 바로 그 틈 속에 인간의 존엄을 남겨두었다. 카뮈가 “시지프는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조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그 운명의 주인이 된다. 영화가 끝나면 발견되는 온기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해도, 그 무게를 견디며 미래를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을 준다. 아키 카우리스마키가 우리에게 건네는 유머는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며, 조용한 연대의 온기이자 한 해를 지내며 바랜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웃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