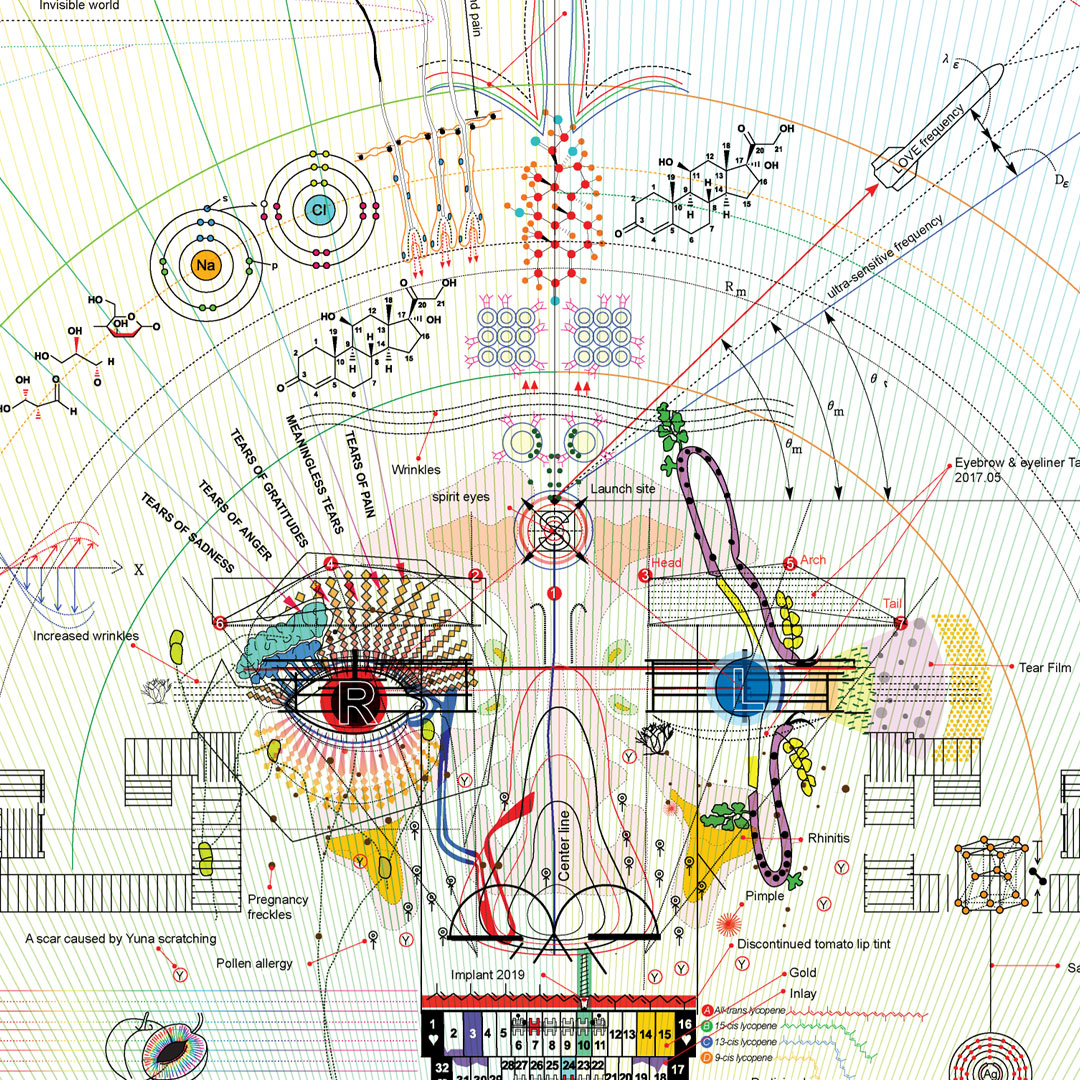* ‘Icon・Index・Symbol’ 시리즈는 배재희 디렉터가 선곡한 음악과 함께 즐겨보세요.
왜 ‘그 책’이 1번이어야 하는가
문학을 쓴다는 것, 그중에서도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간다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도 매혹적인 형벌이다. 소설가들은 자신의 세계를 열어젖힐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 헤맨다. 첫 문장은 단순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구축하려는 세계의 공기, 온도, 그리고 질서를 단 한 줄로 압축한 에센스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설의 첫 문장들을 수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많은 세계의 입구를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포만감을 느끼는 일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출판사가 내놓는 ‘세계문학전집 1호’는 단순히 인쇄 순서상 가장 먼저 찍힌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 출판사가 문학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우리는 문학의 기원을 이것으로 정의한다”라는 무언의 선언이다. 첫 발걸음은 언제나 방향을 결정한다. 수천 년의 문학사 속에서 어떤 작가, 어떤 문장을 전집의 첫 페이지로 삼느냐는 질문은, 그 출판사가 세계를 어떤 질서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민음사: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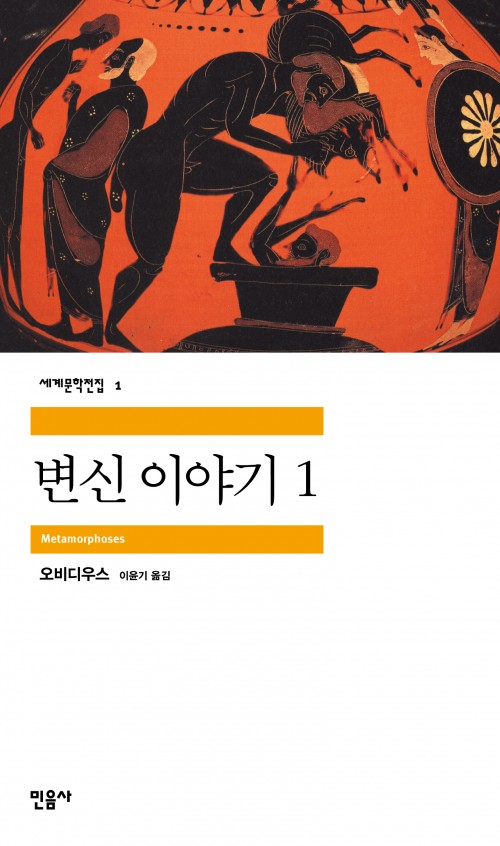
민음사는 오비디우스Ovidius의 <변신 이야기>로 문을 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서사가 아닌 ‘형태의 변화’를 첫 번째 가치로 선택했다. 신화와 인간,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이 작품을 통해 민음사는 세계를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변신의 언어’로 읽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들에게 문학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를 새롭게 이름 붙이는 행위, 그 역동적인 은유 자체였다.
문학동네: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반면, 문학동네는 톨스토이Лев Толстой의 <안나 카레니나>로 시작했다. 안나의 비극적인 사랑과 레빈의 고뇌가 교차하는 이 방대한 서사는 사랑, 도덕, 가족, 사회라는 인간 삶의 총체적 문제를 다룬다. 문학동네가 출발선에 놓은 것은 신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서사적 복잡성이었다. 개인이 사회적 질서와 내면의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무너지는가. 문학동네는 파멸과 구원의 리얼리즘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오늘의 인간’을 발견하고자 했다.
열린책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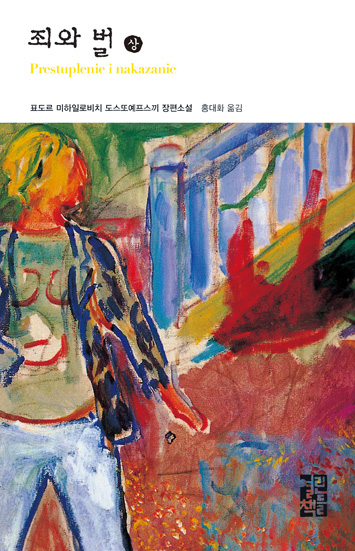
열린책들은 도스토옙스키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의 <죄와 벌>로 강렬한 붉은색 표지를 선보이며 시작했다. 이는 출판사의 뿌리가 러시아 문학에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문학을 사회적 기록이 아닌 ‘영혼의 실험실’로 규정하는 태도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과 그 이후의 고열 같은 섬망은 인간 내면의 분열, 도덕의 경계,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심연을 파고든다. 열린책들의 선택은 독자에게 안락한 독서가 아닌, 불편하고도 치열한 사유를 요구한다. 인간은 선과 악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서성이는 존재이며, 문학은 그 위태로운 서성임 자체를 현미경처럼 관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1권에 담겨 있다.
을유문화사: 토마스 만 <마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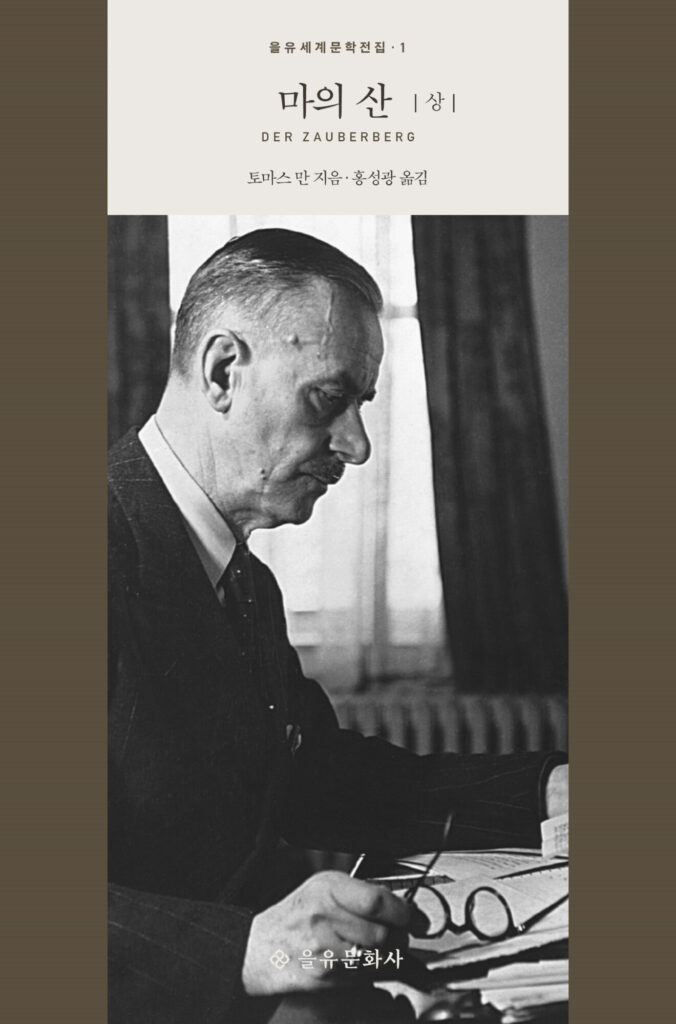
을유문화사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마의 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1959년 국내 최초로 세계문학전집을 펴냈던 그들이 2008년 새로운 전집을 기획하며 다시 선택한 1권이다. ‘마의 산’은 육체의 병이 정신의 사유로 치환되는 장소이며, 고립된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문명과 예술, 죽음과 시간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는 지성의 무대다. 을유의 선택은 문학을 ‘사유의 훈련장’으로 보는 고전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고전의 품격이란 단지 오래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시간의 병을 견디고 사유의 탑을 쌓아 올리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창비: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터의 고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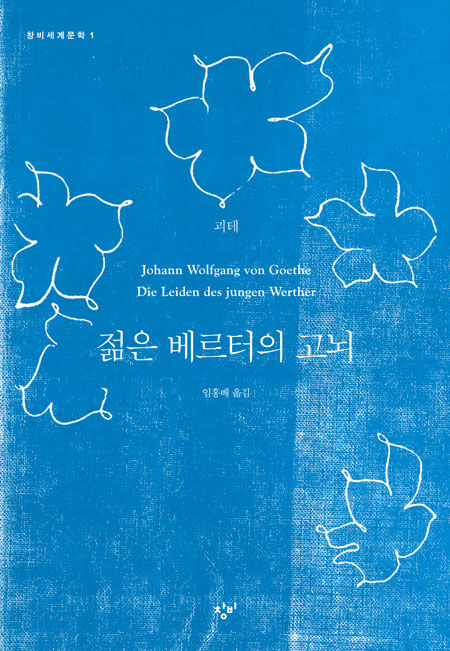
창비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1권으로 삼았다. 지극히 낭만적인 연애소설을 첫 권으로 택한 것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그러나 베르터의 고뇌는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정직함이 시대의 경직된 질서보다 중요했던 한 젊은 영혼의 투쟁이다. 그 낭만적 파국은 문학이 개인의 가장 내밀한 내면을 통해 거대한 사회의 벽을 두드리는 과정을 상징한다. 창비는 이 책을 통해 문학의 출발점을 ‘감정의 진실’에 두었다. 세계문학은 한 인간의 마음이 세계와 부딪힐 때 발생하는 뜨거운 진동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휴머니스트: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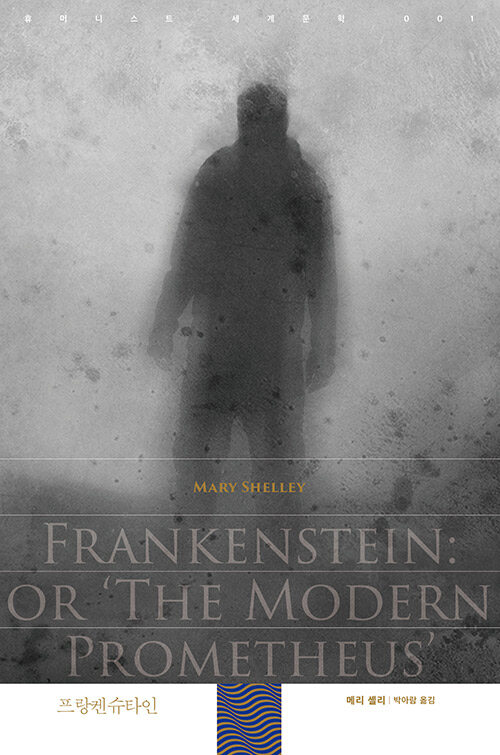
마지막으로 휴머니스트는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으로 세계를 열었다. 신화나 고전적 영웅담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를 맨 앞자리에 둔 것은 파격적이다. 과학 기술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생겨나는 비극,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의 고독. 이 선택은 문학을 아름다운 구원이 아닌, ‘경고의 거울’로 삼겠다는 태도다. 휴머니스트는 19세기의 가장 기괴한 상상력을 통해, 기술만 남고 윤리가 사라진 21세기의 우리에게 “무엇이 인간인가”를 묻는다.
이렇게 펼쳐 놓고 보면, 각 출판사의 첫 권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서로 다른 좌표를 가리키고 있다. 민음사의 변신은 형태의 끝없는 탐구, 문학동네의 안나는 삶의 총체적 리얼리즘, 열린책들의 도스토옙스키는 내면의 심연, 을유의 토마스 만은 지성의 건축술, 창비의 괴테는 감정의 혁명, 휴머니스트의 프랑켄슈타인은 문명의 이면. 모두 다른 첫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지향점은 놀랍게도 하나로 모인다. 그것은 바로 문학이라는 오래된 세계를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는 약속이다.
세계문학전집의 첫 번째 책은 그래서 언제나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그것은 서점에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는 어떤 세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출판사의 뜨거운 선언이다. 각 출판사는 그 선언을 백 마디 말 대신 한 권의 책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가에 꽂혀 여전히 조용하고도 묵직하게 세계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어느 세계의 문을 가장 먼저 열 것인가.